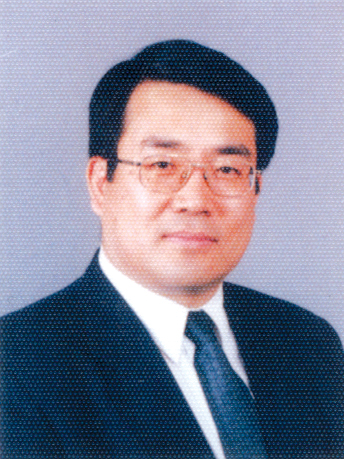
죽음 앞에서 생각하는 ‘좋은 죽음’
< 안만길 목사, 염광교회 >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여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지난 8월 한 달 동안 연이어 세 차례 장례를 치렀다. 연로하시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게도 뜻밖에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
죄의 삯으로 주어지는 죽음은 그 누구도 저항하거나 물리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요즈음 현상을 보면 죽음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물론 죽음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이 약간 어패가 있지만 자연적인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대는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물리치는 시대인 것 같다. 죽음과 그야말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크게 기인한다고 하겠다. 중환자실에 심방하다보면 엄청난 의료기계의 힘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이 다가 올 때는 그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의 재림시까지 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론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과정과 그 미래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톨스토이가 ‘사람들이 겨울은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 말에 동의하게 된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느냐고 늘 묻던 존 웨슬리(John Wesley)도 정작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15세기 후반에 와서야 유럽에서는 ‘아르스 모리엔디'(Ars Moriendi) 즉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여 죽음을 준비하게 하였다고 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부르심을 거절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그 부르심을 연장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것 같다. 꼭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가? 인생을 살다가 때가되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일 것이다. 해가 지면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이다.
이것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물론 인간적인 정으로서 좀 더 함께 지낸다면 좋겠지만 인생살이가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아르스 모리엔디’ 더 나아가서 거룩한 ‘아르스 모리엔디’를 넓혀 나가야 하겠다. 즉 좋은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겠다.
좋은 죽음이란 결코 무병하고 편안하게 맞는 죽음이 아니다. 고 장경재 목사님과 사모님은 죽을 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 기도가 결코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 기도를 멈추셨다고 한다. 참 깊은 신앙의 결과이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인위적인 생명연장을 과감히 거절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과 결단의 문제이다. 아울러 가족의 결단도 필요한 것이다. 법적으로도 사전의료의향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을 잘 이해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그 결심을 한다면 인위적인 생명연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좋은 죽음이란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잘 죽는 것이란 우리가 남겨두고 갈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미래의 삶을 기대하면서 말년을 사는 법이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남기는 많은 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 있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이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좋은 죽음은 죽을 때 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제 은퇴하고 노년이 되었으니 편안하게 쉬자는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는 삶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지은 폴 브랜드(Paul Brand)는 그의 어머니 선교사를 소개하였다. 69세로 은퇴를 권고 받았지만 26년 간 죽음을 눈앞에 두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선교회의 지원도 없이 산악 지방을 찾아 작은 오두막을 짓고 26년 간 더 사역하였다. 고관절 골절과 마비증세 때문에 대나무 지팡이 두 개에 몸을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늙은 말을 타고 약상자를 뒤에 실은 채 산악지방을 구석구석 누볐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 주었다.’ 브랜드 여사는 96세로 세상을 떠났다.(죽음을 배우다, 랍 몰 IVP P.222)
이것이 좋은 죽음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람들마다 세상을 떠나는 방식과 모양은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좋은 죽음을 사모하면서 살 때 우리의 현실의 삶도 좋아질 것이다.






![[목회칼럼] 바울의 삶은 완전했을까?](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5/08/최광희목사2025-218x150.pn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