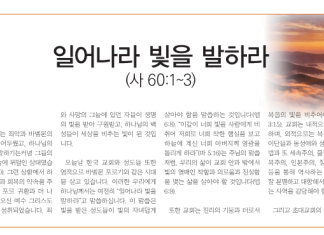새들 초대하기
박종훈 목사 / 궁산교회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가보다. 교회당과 목사관을 새로 짓
기 전, 스레트 지붕의 한옥과 외양간으로 사용했던 창고 같은 예배당에서 아
침마다 지저귀는 새 소리에 잠을 깨곤 했던 시간이 가끔씩 그리워진다. 대문
가에 심겨진 전나무는 많은 참새들이 노는 장소이며 기와지붕으로 된 예배당
은 그들이 알을 낳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한옥의 처마는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부부가 지극한 정성으로 집을 짓고 새끼
들을 키우는 자리이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늘 들려오
는 장소였던 것이다. 가끔씩 제비들이 낳은 알을 꺼내보기도 하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새끼들을 만져보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일이 생각난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십년이 지난 오늘에는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의 그 자리는 옛 모습은 사라지고 번듯하고 살기 편리한 건물
이
들어서 있다. 단열을 위해서 설치된 유리창문은 아침의 새 소리를 잘 듣
지 못하게 하며, 더 이상 제비들이 집을 지을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예전처럼 많은 제비들이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그에 맞게 제비들도 나
름대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황조롱이가 도심 공간에 집을 짓는 경우처
럼), 문제는 제비들의 숫자가 해가 다르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해마다 눈에 띄게 점점 줄어드는 제비들로서는 서까래가 있고 흙으로 된 처마
가 있는 한옥집에다만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듯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자기 맘대로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초청하려면 그만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는 집 주위에 나무들이 있어야 하고 그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과 열매들
이 그들의 먹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에게는 벌레가 생
기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은 나비들이 주로 한다. 나비들이 꽃의 향기를 찾아
오게 하려면 아무 나무에다가 농약을 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과실나무
는 벌레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감나무에도 농약을 뿌리는 추세가 되고 말
았다.
조금 덜
먹더라도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온갓 나비와 벌과
새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들이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깃든 여러
색깔의 모습들도 보기 좋지만 새마다 다른 노랫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생명
의 환희를 느끼게 한다. 조그만 체구에 어쩌면 저런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가 하는 신비함을 느끼곤 한다.
교회정원에서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텃새는 단연 참새이다. 떼로 몰려다니
는 습성으로 아침마다 유난히도 떠들어대는 자들이다. 텃밭에 키우는 두발 가
진 가축들이 먹고 남은 사료들은 항상 그들의 넉넉한 식량이 되며 마당에 떨
어진 깃털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폭신하게 만드는 훌륭한 이부자리의 역할
을 한다.
새로 지은 교회당 이층 지붕은 한식 기와로 덮었기에 참새들의 세(?) 걱정 없
는 만년 자기 집이 되었다. 동백꽃이 필 때는 한 쌍의 동박새가 사람눈치를
보며 자주 날아오곤 한다. 덩치 큰 새가 동백꽃의 꿀을 좋아하는 것이 어울리
지 않게 보이지만 문 앞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여간 반갑지 않다. 무당새라고
하는 딱새는 그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한번은 현관문으로 잘못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번번이 유리창에 부딪치는 녀석을 손으로 잡을 기회가 있
었다. 보기보다 매우 가냘픈 몸매였다. 겨울에도 가까이서 자주 만났던 그 새
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아이들에게도 구경시킨 후 날려보냈다. 두근두근 뛰는
그 새의 가슴의 맥박이 손끝에 아련히 전해온다.
이 밖에도 가끔 오는 새는 여기 말로는 미영새라고 하는 박새, 그리고 멀찍이
서 노래하는 듣기가 너무 좋은 휘파람새, 더 이상 길조가 아닌 얄미운 까치
가 지붕 끝에서 쉬었다 가곤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제비가 이제는 귀한 새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압이 낮을 때는 어김없이 낮게 골목안을 날
며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비껴 가는 제비들의 묘기를 볼 수 없을 때는 어쩌면
사람들도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생명이기에 조건만 갖추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있기에 날아드는 새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오랜 시간
을 들여 외롭고도 힘든 교회당 건축을 하면서도 기대한 것은, 완공이 되면 사
람들이 많이 교회에 나올 줄 알았다. 그 기대를 가지고 힘든 줄 모르고 건축
을
했지만 사람들은 역시 새들과는 달리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일년에 한두 사람 정도…, 그나마 한 해에 한 분씩은 소천하는 시골의 현
실…. 가끔 한번씩 방문하는 도시인들은 ‘와!’ 하며 감탄하는데 지역주민들
은 무감각이다.
해마다 재미를 보는지 면소재지에 오는 장사꾼들의 선물공세에는 하루종일 피
곤하게 일을 했어도 저녁 늦게까지 참여하여 결국 불량품을 고가로 사는 할머
니들의 열심(?)을 보면서, 진정 생명의 양식을 거저 주며 그들을 위해 건축
한 교회당에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거부한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그 맛을 알고 때가 되면 찾아오리라 기대
하며 기다린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영화감상문] “신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_김 훈 장로](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2/11/김훈-장로-218x150.jpg)
![[위그노 역사 탐방 후기] 위그노의 믿음을 생각하다_박지은 전도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2/08/박지은-전도사-218x150.jp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