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 언약’ 그리고 유아세례
이남규 교수 합신 조직신학
중생전제설이나 유아세례의 논의의 배경에는 ‘선 택과 언약’의 관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특히 바빙크는 중생전제설과 유아세례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선택과 언약의 관계를 생각했다.
실천적 관점에서 선택과 언약에 관계와 함께 유아 세례를 살펴보는 일은 유익하다.
한편에서 모든 회중을 중생한 자로 여기지만, 다른 편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중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만일 교회가 언약과 선택을 일치시켜 모든 회원이 택자이고 중생했다는 확신과 전제를 가진다 면, 설교자는 더 큰 열심을 요청하는 설교는 몰라 도, “회개하라!”고 회심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살피라!”고 자기 점검을 요청하는 설교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빙크가 중생전제설을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언약과 선택을 완전히 분리시키면, 유아세례를 받은 자녀가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는 그를 중생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거나 열등한 회원처럼 대할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에 대하여 어떤 위로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선택과 언약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중생전제설’도, 또한 선택과 언약을 분리하는 ‘비 중생전제설’도 실천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선택받은 무리와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면서 언약 구성원을 참된 회심으로 부르는 것은 항상 정당하 다. 따라서 목사가 세례받은 성인 및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복음에 약속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경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심지어 목회적 의무다. 사실 지상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그의 생애 전체가 회개의 길이다. 그러나 신앙고백을 하기까지 중생하지 않은 것처럼 추정하는 일도 잘못된 태도다. 믿음과 회개의 요청이 정당하며 필요하나, 세례와 중생을 분리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사용하시는 만큼 교회는 세례받은 자녀의 중생을 사랑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이 지교 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언약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언약의 내적 실행과 외적 실행의 불일치가 늘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는 세례받은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언약의 외적 실행이 내적 실행과 일치한다. 반면 광신주의자들의 경우는 성령의 내적 실행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언약의 외적 실행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우리는 언약의 외적 실행과 내적 실행의 완전한 일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외적 실행 자체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즉, 물세례 자체가 중생하는 능력을 갖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약의 외적 실행과 내적 실행을 분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적 실행은 내적 실행의 공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세례는 성령의 중생의 씻음의 공적인 표이다. 내적 실행과 외적 실행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언약의 이중적 국면은 성경적이니, 주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그냥 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마 13:28-30).
우리는 신자의 자녀가 중생했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세례를 주지 않고 언약에 속해 있으므로 세례를 베푼다. 교회는 무책임하게 신자의 자녀를 방치해 서도 안 되고 신자의 자녀가 근거 없는 안락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언약의 자녀가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회개의 길을 걷도록 목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비 중생을 전제하여 신자의 자녀가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언약 안에서 이른 시기에 죽어간 자녀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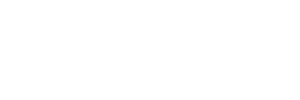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