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춘 에세이
차별 없는 세상
<이종섭 시인 _ 찬미교회 목사, 문학평론가>
나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좋아한다. 그러나 마당이나 정원, 또는 텃밭이 딸린 집이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정확하게 말해서 단독주택보다 마당과 텃밭을 더 좋아한다고 해야 맞다. 누구는 아파트에 살면서 주말농장을 분양 받아 텃밭을 가꾸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집과 멀리 떨어진 텃밭에는 흥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밖에 나가 바로 야채를 뜯어 먹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텃밭이라는 지론 때문에 그 편한 아파트조차도 접고 살아간다.
그런 마음이다 보니 결국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한 귀퉁이를 텃밭으로 만들기도 하고, 텃밭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그 텃밭을 이모저모 더 알차게 꾸려가면서 지내는 일이 이사에 얽힌 추억담이 되었다. 남들은 편안한 집을 보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텃밭이나 집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면 만족한다. 그래서 한때 텃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 뒤가 바로 야트막한 산으로 연결된 그런 집에 산 적이 있었다. 결혼 후 방 한 칸에서 시작해 아늑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방 한 칸에서 시작해 텃밭은 물론 집 뒤로 작고 낮은 산이 연결된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으니 말이다.
텃밭만 있는 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산과 연결된 집에 살다보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곤 했었다. 종종 작은 곤충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밖에 널어 두었던 빨래에 묻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텃밭에서 뜯어온 야채류에 딸려서 들어오기도 했다. 이름 모를 풀벌레들과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을 통틀어 달팽이를 제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야채를 씻다가 싱크대를 기어오르는 달팽이를 가만히 떼어 내 밖에 던져주는 것은 제일 흔한 풍경이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내면의 정서를 나도 모르게 확인하면서 아주 맑고 향기로운 차 한 모금이 가슴 속에 그윽하게 퍼져가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자주 반복하다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인 일상에 파묻혀 작은 생명체를 밖에 던져주는 행위로 그칠 때도 많았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다. 벌레에 민감한 큰 아이가 소리를 질러 달려가니 아주 작은 연둣빛 여치 새끼가 보였다.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손바닥에 동그란 공간을 만들어 조심조심 잡은 후 밖으로 나가 다칠세라 안전한 곳에 놓아주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곤충은 여치만이 아니어서 어떤 날은 더듬이를 가만가만 움직이고 있는 초록빛 작은 방아깨비가 보이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는지라 그날도 벌레가 들어왔다는 비명 섞인 말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 벌레가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달아나버렸다. 바퀴벌레라고 짐작한 아내가 가져온 약을 뿌리니 다행히 벌레가 밖으로 기어 나와서 죽었다. 휴지로 벌레를 싸서 버리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바퀴벌레가 아닌 귀뚜라미였기 때문이다. 살림을 하는 아내는 바퀴벌레가 아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나는 작은 생명 하나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여 버린 것이 못내 신경이 쓰여 불편한 마음을 오래도록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무거워진 마음을 달래려고 했을까.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차올랐다. 세상에서 종종 듣고 보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취향과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외모나 색깔로 차별하지 않는 세상, 나 자신의 기준으로 홀대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하나의 사건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으면서 때때로 ‘존중’과 ‘차별’이라는 아픔과 각오를 새롭게 해주는 사건. 청소년 시절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을 때 책을 산 동남아시아인이 문 밖을 나서자마자 무시하는 말을 해대는 직원들을 보며 어린 나이에 꽤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키 작고 피부색이 검은 외국인은 그저 책을 샀을 뿐인데 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인지, 그것을 지켜본 내 마음이 당혹스러웠고 마치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얼굴 빨개진 부끄러움으로 어쩔 줄 몰라 했었다.
그것이 계기였을까. 아니면 이미 배우고 익힌 가치관이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장되었던 것일까.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껏 산다고 살아왔는데, 작은 벌레 하나를 대하는 행동으로 인해 차별에 대한 나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할 노릇이었다. 검은 벌레라고 해서 순식간에 죽여 버린 한 사람. 그래 그게 내 본 모습이다. 차별의 피가 흐르는 내 본성이다. 연둣빛 고운 여치를 집 안에서 발견하면 더듬이나 날개가 다칠까봐 손을 동그랗게 오므린 채 조심조심 잡은 후 풀밭으로 가서 살짝 놓아주지만, 귀뚜라미 같은 검은 벌레들을 발견하면 대충 잡아 현관에서 아무렇게나 휙 던져버리는 것을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말이다.
* 이종섭 시인은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바람의 구문론』『물결무늬 손뼈 화석』 등의 시집을 상재하였으며 수주문학상, 시흥문학상, 민들레문학상 등을 수상하였고 목회와 함께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평] 문정식,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2/wem-218x15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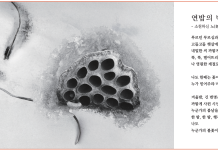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