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생과 유아세례
이남규 교수 합신 조직신학
카이퍼의 ‘중생전제설’은 그의 ‘직접중생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는 유아에게 새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의 사례처럼 유아세례 이전의 매우 이른 시기일 수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카이퍼는 이른바 ‘휴면 중생’(dormant regeneration)을 주장하는데, 이는새 생명의 씨앗이 겨울 땅속의 씨처럼 발아하지 않은 채, 즉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그는 이들을 생명의 씨를 가진 자, 곧 좁은 의미에서 중생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에도 많은 개혁신학자에게 우려를 자아냈다.
“유아에게 믿음의 씨가 주어졌으나, 오랜 세월 동안 발아하지 않고 회심 없이 불신 상태로 머물 수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실행을 혼동하는 인상을 준다. 새 생명의 씨가 여전히 발아하지 않은 채 불신 가운데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아직 시간 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중생’ 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시간 속에서 실제로 부르시고 중생시키시는 사역과 구분 되어야 한다.
시간과 영원의 경계를 흐리는 이러한 사고는 카이퍼의 ‘영원으로부터의 칭의’(Gerechtvaardigd van Eeuwigheid)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카이퍼는 칭의가 회심의 순간이나 출생 이후가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열매가 되며, 우리가 의식하는 칭의는 믿음의 결과로 경험하는 ‘주관적 칭의’에 불과하다. 그 결과, 영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 칭의’는 그 자리를 잃고, 오직 주관적 칭의만 남게 된다.
직접중생론은 또한 중생과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을 분리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카이퍼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중생했으나 잠들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적 소명 이전의 중생 개념을 도입했다. 이 에 대해 바빙크는 도르트 총회가 ‘직접적 은혜’ 혹은 ‘직접적 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지적한다. 그것은 이 용어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직 접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만일 이를 말씀과 분리된 비매개적 사역으로 이해한다면그 신학적 위험은 매우 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한다. “유아기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방식과 장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선택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 진술은 유아의 중생이 말씀과 무관하거나 말씀과 분리 되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비록 유아가 외적 부르심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여전히 말씀의 내용과 결합하여 역사하신다.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은 말씀과 분리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유로운 능력이다.
따라서 유아에게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카이퍼가 말한 ‘발아하지 않은 생명의 씨’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중생한 아이는 성장하여 능력이 생기면, 그에 따라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분명히 나타난다.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는, 그가 가진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의 분량에 따라 말씀에 대한 응답, 곧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뒤따른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절은 카이퍼의 휴면 중생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아가 외적 소명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중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일하신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중생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인정하 면서도, 그것을 말씀과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 바빙 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외적 부르심으로 선포하게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녀를 하나 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탁할 뿐 아니라, 그들이 자라 가는 동안 말씀과 성례 등 은혜의 방편을 통해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가르치고 돌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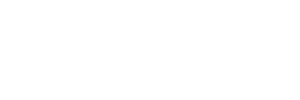





![[군 선교 보고]기도로 세워지는 철마교회, 그 은혜의 현장을 다녀와서_이강숙 권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1/KakaoTalk_20260116_140933542-218x150.jp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