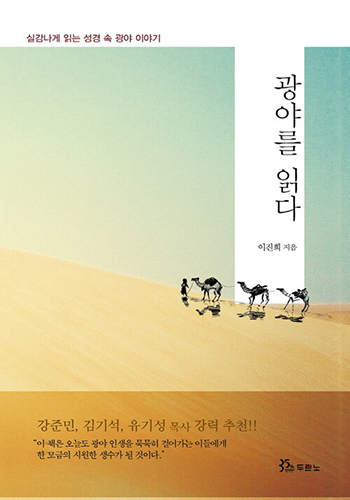
「 광야를 읽다 」를 읽고
김세은 집사/ 서서울노회 온수교회
얼마 전 어떤 책에서 ‘정의하는 행위’의 강력 함에 대해 읽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것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만의 눈으로 상황과 사람, 사물을 정의할 때비로소 상황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 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은 자기만의 안경을 쓰는 일이고, 신앙의 힘은 해석의 능력에서 나온 다고 하셨다.
비슷한 맥락에서 『광야를 읽다』의 저자는 인생을 광야로 정의한 것 같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길고 고단한 사막을 살아내는 것으로 교정할 때, 마주하는 사람, 상황, 사물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 누구는 패배주의 관점이고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하지만 굉장히 현실 적이고 오히려 강력하게 낙천적인 관점이 아닐까?
젊거나 건강하고, 능력이 출중한 데다 풍족한 경제 여건에 놓여있다면 세상은 정복해야 할 산처럼 보일 수 있다. 아니, 개인의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이 여유롭고 미래가 예측가능해 보이면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호기로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과거나 현재 그어느 때에도 미래가 불안하지 않던 때는 없었 고, 우리의 비루한 육신은 어느새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광야처럼 오늘의 세상은 불과 5년 전과도 너무 다르고, 당장 내년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무능과 무력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만을 고집 한다면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또 누군 가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느니 차라리 삶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할 수 있다. 야심 차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길이 결국엔 막다른 골목이었고 허무한 절벽이 었다. 반면, 나와 처지를 동일시해 목숨 걸고 나를 환대하는 베두인과 같은 친구들이 있고, 악천후를 막아주는 장막이 있으며, 길을 아실 뿐 아니라 길 자체가 되시는 목자와 함께 그늘 로, 오아시스로 움직이는 삶은 수동적으로 보이나 비교할 수 없이 도전적이다.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삶이란 눈가 리개를 쓰고 인도자의 목소리에만 의지해 발을 내딛는 삶이니 얼마나 불안한가. 한 발 한발이 도전이다.
하지만 마침내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눈을 들었을 때 내가 서 있는 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닌 내 상상과 이성을 초월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임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안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도전의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싶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뒤늦게 원망하지 않도록. 낙타의 하루와 끝이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처럼 매일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광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풍경이있는묵상] 태백의 목필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2/954p-218x150.png)

![[서평] 문정식,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해설』](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2/wem-218x150.pn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