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선교
최 욥 선교사/ HIS, 선교한국 사무총장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에서 그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복음의 수입국에서 수출국 으로 변화된 나라이다. 복음이 들어온 지 120 년 만에 이 작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고 세계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에 주목했다. 그러나 벚꽃처럼 만개하 였던 한국의 선교 운동은 오늘날 벚꽃 엔딩을 맞이할 위기에 처하였다. 90년대 한국 선교사의 70%를 차지했던 20-30대 선교사는 오늘날 전체 선교사의 7%도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선교사의 평균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며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많은 선교 단체에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발간한 『청년 트랜드 리포트 2022』에 따르면 기독대학생의 14.8%가 장기 선교사가 되는 것에 열려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무려 6만 명이 넘는 숫자다. 만약 청년들은 여전히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기존의 선교구조 속에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 선교 생태계에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청년들의 이탈은 비단 선교계만의 현상이 아니다. 교계와 캠퍼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20~40대 개신교인은 절반으로 줄었다.
30~40대 개신교인 3명 중 1명은 교회에 안나가는 성도인데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42% 에 달한다. 학원복음화협의회 통계를 보면 10 년 전 기독교 대학생 중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은 63%였지만 최근에는 33%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미증유의 청년층 이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먼저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 해야 한다. 그들이 왜 자신이 자라온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는 지, 그 어떤 전문가의 예단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에게서 듣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말이 다 옳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들도 동시대의 주역으 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기초는 자유 로운 소통의 존중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년들에게 기존 사역의 틀을 ‘탑다 운’(하양식 의사결정)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스타일이 기여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 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특징은 압축근대화 (Compressed Modernity)이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도 세대 간 다양한 신앙의 양태가 존재하는데, 산업화 시기의 신앙은 기복적 이었으며, 민주화 때는 대의적이었고, 정보화 시대에는 소비적인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오늘날 다원화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기복적, 대의적, 소비적 신앙보다는 자아실 현의 진정성에 더 크게 공감하고 그 힘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20대들이 OECD 회원국인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세대라는 것이다. 기존 세대는 ‘fast follower’로서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바빴지 만, 저들은 K-컬쳐의 ‘first mover’로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K-선교에도 이들이 주도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세 반석으로 고백한 다. 이는 기독교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영속적 적절성(eternal relevance) 확보해 왔다는 의미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질문은 ‘What is true’였고 주로 진리의 당위성에 헌신했다. X세대는 ‘What is real’의 질문을 가지고 선배들에게 ‘그것이 옳다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들이 투입되면 사역 현장에서 효율적 구현이 일어났다. 그런데 MZ세대의 질문은 ‘What is good’, ‘What is beautiful’이다.
아무리 그것이 옳고 또 작동이 된다고 해도 아름답지 않으니 진리가 아니라고 그들은 반응한다. 여기에 충격과 기대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당성과 기능성뿐 아니라 미학의 요소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가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청년 여호수아를 가진 민족은 복이 있다(출 33:11). 그는 사명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늙은 히스기야가 많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도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이다(왕하 20:19).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급격한 하강기는 시작되었다.
한국교회는 청년들을 세워야 하는 절박한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필자는 늘 궁금했다.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혜성처럼 등장하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는 누가 키웠을까?
분명한 것은 누군가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남은 청년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주었 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새 시대에 새 술을 담을 새 부대가 만들어졌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토양이 되어 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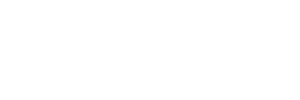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