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세례 논쟁을 둘러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갈등
이남규 교수 합신 조직신학
한국 교회에겐 다소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네덜 란드 개혁교회는 ‘유아세례의 근거’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인해 교회 연합과 분열의 역사를 지나왔다. 그 역사적 배경을 이번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에 신학적 쟁점에 더 집중하기로 한다.
19세기에 세속화의 흐름에 있었던 ‘네 덜란드 국가개혁교회’(Ne derl a nd s e Hervormed Kerk)로부터 두 큰 교단이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먼저 1834년, 세속화된 국가교회에 저항하며 소위 ‘분 리파’(Afscheiding)가 시작된다. 이들은 1869년 ‘기독개혁교회’(CGK)를 형성했다.
이들은 캄펜에 학교를 세웠고, 우리에게 잘알려진 헤르만 바빙크는 처음에 이 교단 소속으로 캄펜에서 가르쳤다. 이후 국가교회 안에서 갱신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1886년 아브라함 카이퍼 주도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을 소위 ‘애통파’(Doleantie)라 부른 다. 1892년 ‘분리파’와 ‘애통파’가 연합하여 ‘네덜란드 개혁교회’(GKN)가 탄생했다. 분리파 출신 바빙크는 연합 이후 1902년 캄 펜을 떠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가르 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연합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분리파는 카이퍼의 신학 사상을 의심하면서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대로 ‘기독개혁교회’로서 아펠도른에 학교를 세웠다.
갈 등 의 씨 앗 은 소 위 ‘ 중 생 전 제설’(presumptive regeneration)이었다. 카이퍼는 신자의 자녀에게 새 생명의 원리인 중생의 씨가 심겨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이미 중생했다고 전제하고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카이퍼는 유아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준다고 주장했다. 유아가 비록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지라도 믿음의 씨가 그 아이에게 있고, 믿음의 씨는 20년, 30년, 60년 후에 발아한 다는 것이다. 나중에 자라기 때문에 아직 회심하지 않아도 발아하지 않은 믿음의 씨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네덜란드 개혁교 회의 세례예식서에 있는 부모에게 하는 첫질문, 곧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서 모든 종류의 비참, 곧 저주 자체에 처했음에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그래서 그의 교회의 지체로서 세례받아야 한다고 당신은 고백합니까?”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카이퍼에게 성령에 의한 내적 갱신이 었다.
바빙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언약적 거룩’이었다. 바빙 크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자녀를 이미 모태 에서 중생시키실 수 있고, 또는 자녀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부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에 근거해서, 즉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에 반대했다. 물론 카이퍼의 견해가 개혁신학 안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개혁신학자들이 세례 요한을 근거로 해서(눅 1:15) 신자의 자녀가 어려서 중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특정 시간에 묶는 것에 반대했는 데, 세례 전일지, 세례받을 때인지, 세례 후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바빙크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세례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에 대한 언약의 약속 때 문에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언약의 자녀들이 결국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 믿음과 회심으로 나아와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이퍼가 중생 전제설과 함께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중생 전제설은 결국 세례에 의해 중생의 은혜를 얻는다는 로마가 톨릭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바빙크는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가 냉랭 하게 식은 채로 전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단 내 갈등이 심화되자 헤르만 바빙크는 1901년부터 교단지 <나팔>(De Bazuin)에 일 년 넘게 연재하면서 이 논쟁을 다루었으며 ‘소명과 중생’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Roeping En Wedergeboorte, 우리말 번역은 『바빙크의 중생론』(CLC)이다). 이후 바빙크는 그의 대작 『개혁교의학』 개정판(1906–1911)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사유를 드러냈다. 바빙크는 카이퍼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려를 드러 내면서도 카이퍼가 심하게 비판받지 않기를 바랬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905년 우트 레히트 총회를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판단 을 내리면서 봉합된 듯 보였으나 모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카이퍼의 주장에 권위를 주려는 흐름과 이를 비판하는 세력 간의 긴장이 계속되었고, 결국 1944년 클라스 스킬더(Klaas Schilder)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 GKv)가 분리되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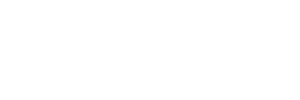





![[군 선교 보고]기도로 세워지는 철마교회, 그 은혜의 현장을 다녀와서_이강숙 권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1/KakaoTalk_20260116_140933542-218x150.jp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