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신학 기획
유아세례, 다시 개혁신학의 자리에서(1)
도전 앞에 선 유아세례
이남규 교수 합신 조직신학
오늘날 유아세례는 여러 도전 앞에 서 있다. 2019년 예장 통합측은 유아세례 받은 유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부 안에 성찬에 참여하는 아이와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분리되자 2021년 유아세례 연령을 6세까지로 늘리고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에게 ‘아동세례’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예장 합동측은 2017년 어린이세례를 도입하여 만 6세까 지는 유아세례를, 이후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아 및 어린이에게 성찬을 허용한 통합측과 달리 합동측은 유아 및 어린이 성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유아세례를 베풀 것인가?”라는 유아세례의 정당성 질문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지금은, “세례 받은 아이가 왜 성찬에서 제외되 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어린이가 믿고 있다면 왜 세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등의 신학적으로 복합적인 여러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려고 한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네 가지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아세례에 관한 네 가지 주요 쟁점
첫째,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유아세례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재세례파는 수세자의 믿음 확인 없이 주어지는 유아세례를 반대했 으며, 개혁신학자들은 이 반대에 언약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답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창 17:7)이라고 하신다면, 언약의 통일성 아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도 동일 하게 언약이 적용되므로 현재 신자의 자녀도 언약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쟁점에서 나타난 중요 질문은 이것이다. 언약의 권리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가? 아니면 신자의 자녀에게도 주어지는가?
둘째, 19세기 개혁교회 안 에서 발발한 유아세례의 근거 논쟁이다. 19세기 후반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가 신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줄 때 신자의 자녀가 선택 받은 자로서 중생했다고 간주하고 세례를 준다고 주장했다. 카이퍼에 대한 신뢰 문제로 ‘분리파’(Afscheiding)와 ‘애통 파’(Doleante) 사이의 긴장이 있었으나 1905년 우트레히트 총회에서 봉합된 듯보였다. 그러나 결국 여러 교회가 ‘네덜란드 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에 합류하지 않고 ‘기독개혁교 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교단으로 남았다. 통합된 교단 내에서도 긴장이 계속되다가 1944년에는 끌라스 스킬더 (Klass Schilder)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개혁교회(해방파)’(Gereformerde Kerken in Nederland, vrijgemaakt)라는 교단이 분리되었다. 이 논쟁에서 나타난 질문은 이것 이다. 언약과 선택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불일치하는가? 언약과 선택은 어떤 관계인가?
셋째 쟁점은 유아성찬에 관한 질문이다.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사인 입교 전이라도 신자의 자녀가 이미 언약의 권리를 갖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찬에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대에 일어났다. 이에 따라 합신 충청노회가 유아성찬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작년 109회 총회는 신학연구 위원회의 연구 보고를 받게 되었다. 총회 보고서는, 신자의 자녀가 가진 언약의 권리를 인정하여 세례를 베풀었다면 당연히 성찬에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성찬 참여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해당한 다는 개혁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다시 확인 했다. 성찬 참여 조건은 언약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넷째, ‘아동세례’ 또는 ‘어린이세례’의 허용에 관한 질문이다. 통합측은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세례’를, 합동측은 7세부터 13까지 ‘어린이세례’를 허용하는데, 두 교단 사이에그 유효성에 대한 인정에 차이가 있다. 통합 측에서 아동세례를 받은 교인은 성찬에 바로 참여하고 나중에 입교가 따로 필요가 없지만 유아세례교인에게는 입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7세의 어린이가 성찬에 참여 해도 아동세례를 받은 아이는 공적으로 인정받은 세례교인으로 참여하나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아직 신앙고백을 공적으로 인 정받지 못한 채로 참여하는 것이다. 합동 측에서는 어린이세례를 인정할지라도 만 14세가 되어 입교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린이 신앙고백의 유효성을 세례를 베풀 정도로는 인정하나 성찬에 참여할 만큼의 수준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공적 신앙고백의 유효성은 어떤 연령부터 인정 되는가? 세례와 성찬에 요구되는 신앙고백의 수준은 동일한가?
이 쟁점들은 직접적으로는 언약의 통일성, 언약과 선택의 관계, 성찬 참여의 조건, 신앙고백의 유효성과 같은 문제로 드러나지만, 더 확장하면 성령의 역사 방식과 구원의 서정,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 교회 회원권과 언약 회원권의 경계, 그리고 언약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과 공적 신앙고백의 기준등 다양한 신학적 및 실천적 주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관련 쟁점과 주제들을 개혁신학의 일관성 위에서 살펴보고 유아세례의 실천적 의미를 되짚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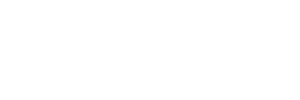





![[군 선교 보고]기도로 세워지는 철마교회, 그 은혜의 현장을 다녀와서_이강숙 권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6/01/KakaoTalk_20260116_140933542-218x150.jpg)


![[풍경이 있는 묵상] 주 헤는 밤_이정우 목사](http://repress.kr/wp-content/uploads/2023/11/DSC00031-324x235.jpg)
